
본다는 것은 눈으로 물체의 형태와 색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는 옛적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 거리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눈에서 빛이 나와 물체를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 안에 색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데카르트는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변형되어 색을 띤 채 우리 눈에 들어온다”고도 하였다. 16세기 이후에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물체에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 물체를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빛은 절대적이다. 빛이 없으면 우리 눈은 물체의 형태도 색도 인식할 수 없다.
빛을 통해 드러나는 만물

물이 담긴 유리컵의 빨대는 꺾여 보이고 물속에서 본 다리는 유난히 짧은 데다 굵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빛이 굴절하기 때문이다.
빛은 일반적으로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어떤 물질을 통과하는지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지나려면 여러 사람과 부딪쳐 속도가 느려진다. 빛도 마찬가지다. 빛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빛이 들어갈 때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굴절이 일어나는 것도 물질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때 빛의 일부가 경계면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반사라고 한다. 물체에 반사된 빛이 눈의 시각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사과 하면 빨간색이 떠오르듯 주위에 보이는 물체들은 제각기 형태뿐 아니라 색을 띠고 있다. 우리는 물체들의 색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 하는데 이는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빨강(R), 초록(G), 파랑(B)의 세 가지 계통으로 묶어 빛의 삼원색1이라 한다. 이 세 가지 빛의 적절한 조합으로 모든 색깔의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빨강, 초록, 파랑을 동일한 비율로 모두 섞으면 흰색이 되고, 빨강과 초록을 같은 비율로 섞으면 노랑(Y),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자홍(M), 초록과 파랑을 섞으면 청록(C)을 띤다. 물론 세 가지 빛 모두 없으면 검게 보인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모니터,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각종 영상장치들은 모두 빛의 삼원색을 조합하여 색을 구현하고 영상을 만들어낸다.
1. 빛의 삼원색: 모든 색깔의 빛에서 바탕이 되는 색으로 빨강, 초록, 파랑을 말한다. 모든 색의 기본이 되는 ‘색의 삼원색(자홍, 청록, 노랑)’과는 구별된다.
색을 띤 물체는 빛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한다.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 빛을 반사하고 이외의 빛은 흡수하기 때문이다. 즉, 사과 자체가 빨간색이라기보다는 빛에 의해 그렇게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빛이 없다면 물체의 모양과 색깔을 알 수 없다. 물체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한다. 물체에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 형태와 색깔을 인식하므로 빛을 통해 주위의 모든 물체가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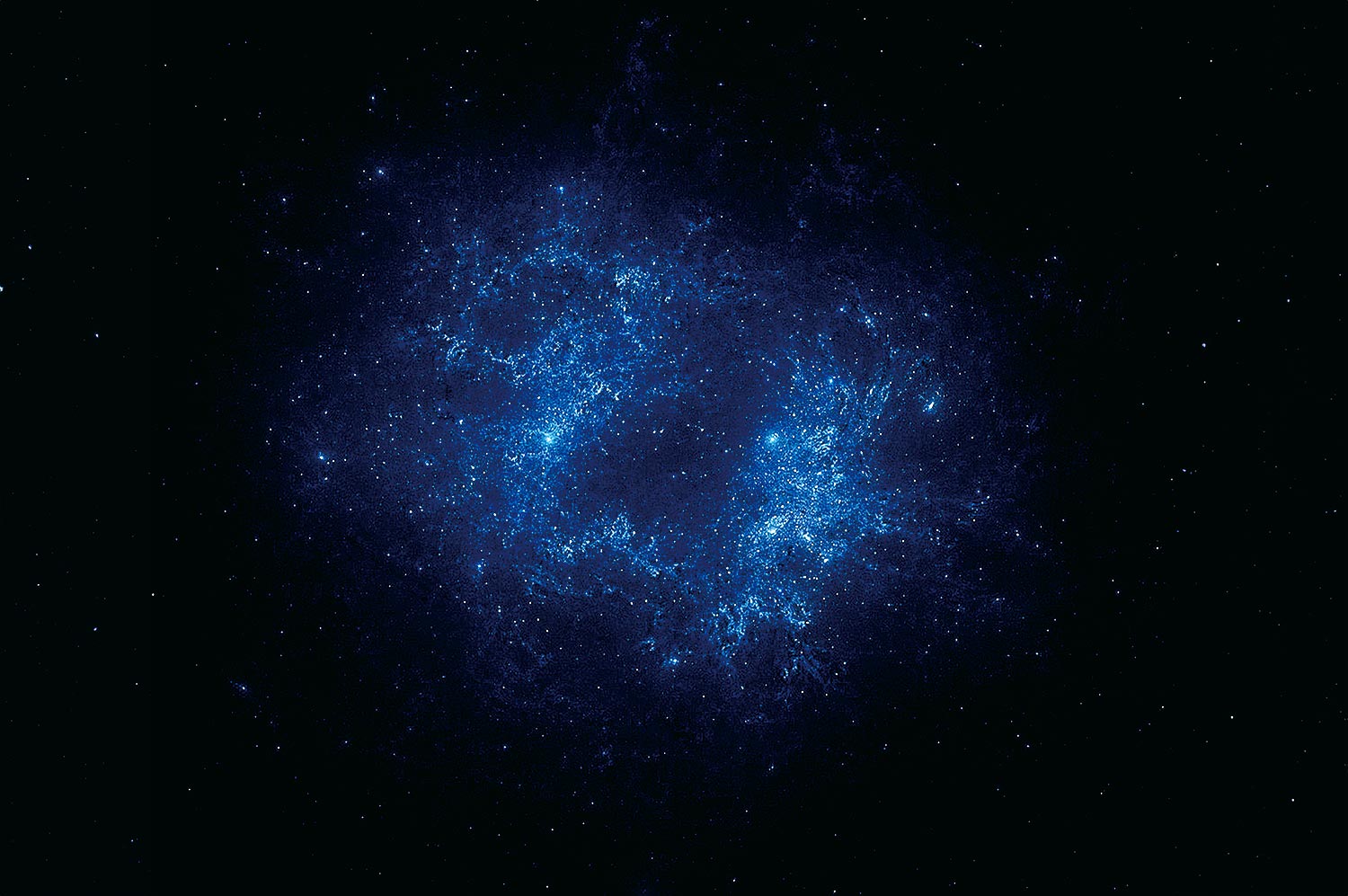
분명히 별이나 은하에서 오는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주 공간은 검게 보인다. 태양 빛이나 별빛은 집에서 사용하는 전구나 형광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데도 우주 공간은 암흑 그 자체다. 왜 그럴까?
우리가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주 공간에는 지구에서처럼 빛이 눈으로 들어오도록 반사할 만한 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광원光源이 눈앞에 있다고 가정하면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밝은 광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원을 등지고 있으면 아무리 광원이 밝더라도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없어 검게 보인다. 만약 주위에 물체가 많다면 어떨까? 물체에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광원을 등져도 빛을 느낄 수 있다.
이 사고실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전등 한 개를 광활한 대지에서 들고 있을 때와 좁은 방 안에서 들고 있을 때 느끼는 밝음의 차이는 확연하다. 대지에서는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고, 방 안에서는 사방의 벽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위가 훨씬 환하게 느껴진다. 밤하늘의 달 또한 마찬가지다. 달은 태양 빛을 반사하므로 눈에 보이게 된다. 달빛은 그야말로 밤에 보는 태양 빛이다.
이처럼 주위에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감지할 수 없다. 빛을 통해 물체가 드러나듯이 빛 또한 물체를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입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투명망토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의 동심을 일깨우는 단골 소재로 여러 영화와 소설에서 활약해 왔다. ‘해리포터 시리즈’ 속에서는 주인공 해리 포터와 친구들이 투명망토를 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종횡무진 학교를 누빈다. 투명망토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
과학자들은 상상의 한 부분으로만 여겨졌던 투명망토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06년, 투명망토 개발의 선봉에 선 영국의 존 펜드리 교수는 투명망토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선보였다. 직진하던 빛이 이 인공 물질을 만나면 마치 흐르는 물이 바위를 만나서 우회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진 물질을 ‘메타물질’이라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마법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 개발된 투명망토는 레이저와 같은 특정한 영역의 빛에 대해서만 효과를 보였고 감출 수 있는 물질도 세포 수준에 머물렀다.
빛은 온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며 가장 빠르다.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존재했던 빛. 그 빛으로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빛은 모든 만물의 원천이다. 만약 빛이 없었다면 온 우주가 암흑을 넘어 완전 ‘무(無)’의 상태였을 것이다2. 빛이 없는 세상과 우주를 상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옛적부터 많은 사람들은 빛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왔고, 빛이라는 단어 속에는 진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 상태에서 제일 먼저 존재했던 것은 빛이며 빛으로부터 기본 입자와 물질들이 생성되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빛이 없었다면 우주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빛이 만물을 드러내고, 또 만물로부터 빛의 존재가 드러난다. 이것이야말로 투명망토보다 더 마법 같은 일이 아닐까.